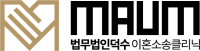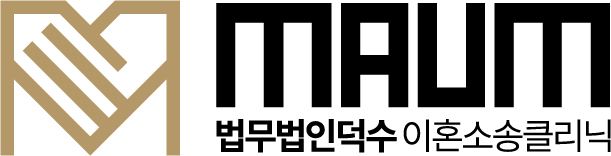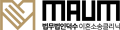관련 링크 :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884
인사치레로 ‘한번 오라’고 했더니 진짜 왔다. 한번 오기 시작하더니 토요일마다 빠짐없었다. 혼자도 아니었다. 매번 2~3명이 함께였다. 한영선 교수(경기대 경찰행정학과)가 서울소년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부터였다. 새내기 변호사였던 현지현 변호사가 ‘평화적 갈등 해결을 지향하는 법조인들의 모임’(평지) 소속 법조인들과 함께 소년원을 드나들기 시작했다. 평지는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을 공부하고 실천하기 위해 현 변호사가 로스쿨 재학 시절 만든 모임이었다.
인사치레라곤 했지만 한 교수의 제안에는 진심과 기대가 담겨 있었다. 당시 한 교수는 회복적 사법 정신에 기반해 소년원 내부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처하는 대화 모임을 꾸리고 있었다. 범죄에 처벌로 대응하는 응보적 사법이 익숙한 사회에서 ‘회복’이라는 단어는 자칫 한가해 보인다. 하지만 재판과 판결 뒤에는 언제나 산산이 깨진 관계와 공동체가 부스러기처럼 남았다. 응보적 사법의 한계를 직시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해온 두 사람이 만난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화해·조정·통합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회복적 사법은 낯설고 외로운 개념이다. 한 교수에게 ‘외부인’인 평지는 든든한 지원군이었다.
평지가 합류하며 대화 모임도 활기를 띠었다. 더 나은 해결 방법을 공부하기 위한 세미나도 한 달에 한 번 정례적으로 열었다. 민사와 형사를 오가며 수많은 의뢰인을 경험하는 동안 회의를 반복했던 1년 차 변호사 시절, 현 변호사에게 소년범과의 만남은 인간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동아줄이었다. “성인 가해자에 비해 미성년 가해자는 적은 시간을 들여도 변화의 가능성과 폭이 훨씬 커요.” 물론 이해로 가는 길은 예외 없이 울퉁불퉁했다. 특히 소년원 아이들은 자신의 상태나 감정을 전달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 대상에 대해 ‘더 많이’ 알려는 노력이, 애씀이 필요했다.
현 변호사가 첫 만남에서 건네는 질문은 정해져 있다. “누가 면회 오시나요? 몇 번이나 오세요?” 가족 중 누구라도 한 달에 한 번이나 오면 다행이었다. 입소해 있는 동안 한 차례도 오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대답에는 말하지 않은 많은 것이 담겨 있었다. 아이들의 발목에 걸린 가난, 결핍, 방임, 방치 따위 족쇄가 보이기 시작했다. “내가 저 친구와 같은 상황에서 성장했다면 변호사가 될 수 있었을까? 아닐 거 같았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남 일’이 아니게 됐죠